7회 0780 서울의 맛 - 서대문 밥상
등록 2019.07.11 20:15
<0780 서울의 맛, 서대문 밥상>
오늘은 일곱 번째 백반기행이다.
서대문구 주민이라는 박은혜씨 마중을 갔다.
경사진 언덕배기를 올라가자니 금세 숨이 찬다.
헬스클럽이 필요 없는 동네다.
박은혜 씨를 만나니 왜 그렇게 날씬한 줄 알겠다
조금씩 볼록 해지는 내 배가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띈다
서대문구는 나의 총각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동네다.
이곳에서 2년 정도 살았던 시절,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는 말이 있었다.
진흙이 가득했던 도로, 사람냄새 물씬 나던 재래시장
❝오늘의 서대문구는 어떤 모습일까?❞
다시 만난 서대문은 참으로 많이도 변했다
고층빌딩과 오피스타운이 늘어선 모습이 낯설다
한산했던 거리로 직장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 점심시간이 된 듯 하다
이곳 직장인들은 뭘 먹을까?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골목 사이로 들어간다
슬며시 골목을 들여다보니 담벼락이 낮은 집들이 늘어서있다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집으로 향했다.
이곳은 ‘돈까스 백반’ 단일 메뉴만 판다고 한다.
메뉴 고민이 필요 없는 곳이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오랜 밥상보가 각 상마다 놓여 있는 게 참 반갑다
짧은 점심시간 장사를 하는 집이라 그런지 반찬을 미리 차려놓았나보다.
그런데 반찬들이 김, 오이무침, 김치 다 밥 반찬들이다
주문을 하니 에피타이저인 비빔국수와 된장찌개가 나온다.
돈가스면 돈가스지 돈가스 백반이 뭘까 했는데,
이렇게 구색 맞춰 나오는 걸 보니 백반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비빔국수를 후루룩 먹고 있으니 갓 튀겨낸 돈까스가 나온다.
이곳에선 고기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밑간을 하지 않은 채
가마 안에서 80%를 익히고, 기름에서 건져내 자기 열로 20%를 익힌단다.
그래서 그런지 튀김옷이 바삭하고 고기는 촉촉하다.
돈까스 소스에 순두부를 넣어 만든 이 집만의 소스도 잘 어울린다.
이곳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하루에 딱 60인분만 판매한다.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주인장의 고집이란다.
손님 입장에선 참으로 반가운 이야기지만 아쉬운 이들도 있을 터.
조금만 늦었더라면 맛을 못 볼 뻔 했다. 오늘 시작이 좋다.
서대문구의 오랜 재래시장, 영천시장 너머 큰길을 걷는데
기계 함흥냉면이라는 간판이 눈에 띈다.
모두가 평양냉면을 외치는 요즘, 왠지 모르게 반갑다.
간판 사이 딱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좁은 골목 끝 가게가 나타난다.
주인장은 냉면 경력만 50년, 이 시장에서만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단다.
물냉 하나, 비냉 하나를 주문했다.
단정한 아낙네의 머릿결처럼 가지런히 얹어낸 냉면 위에
푸짐한 고명, 그리고 육수가 함께 나온다.
옆 테이블에 앉은 시장 상인이 일러주길
막 냉면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장상인들에게 인정받아 온 집이란다.
시원한 육수 입 안 가득 들이키고, 질긴 면발을 쭉쭉 끌어 올리니
온 몸이 시원해진다. 여름엔 참으로 이만한 별미가 없는 것 같다.
소머리, 돼지뼈, 닭발을 넣어 푹 우려낸 사골 육수를
냉면 국물에 섞어 낸다는데,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육수가 자꾸만 당긴다.
박은혜씨가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비냉에 육수를 부어 주는데,
젊은 세대 입맛은 아직 익숙치가 않다.
가게 한 켠에 적힌 ‘고기는 정육점 직접’이 눈에 띈다.
고기 주문을 하면 주인장이 시장 안 정육점으로 직접 가서 사온단다
주인장의 고집스러움이 느껴지는 한상이다.
이번엔 연희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교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그런지 빨간 중국 간판이 눈에 띈다.
그 사이 화교가 운영한다는 대만 음식점을 만났다.
대만식 가정식 백반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다는데,
백반기행 최초 글로벌 백반의 등장이다.
달걀 볶음밥, 감자채볶음, 완자탕을 함께 하면
대만식 가정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감자채볶음과 다를 게 있나 싶었는데
아삭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자꾸 당기는 게
집에서도 해먹고 싶은 요리다.
밥알이 고슬고슬 살아있는 달걀 볶음밥에
이국적인 맛을 내는 완자탕을 먹으니 궁합이 참 좋다.
이곳을 찾은 화교들이 한 숟갈씩 음식을 건네주니
자리에 엉덩이를 붙일 새가 없다.
담장 너머 음식과 함께 정을 나누던 그 옛날이 생각난다.
주문 즉시 빚어내어 낸 교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
바삭한 군만두와 부드러운 찐만두가 합쳐진 듯한 교자.
입 안 가득 육즙이 뿜어져 나온다.

❝여지껏 중화요리는 간격을 조금 두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벽을 타 넘은 듯 하다.
앞으로 중화요리를 좋아하겠다
중화요리 만세. 그 중, 대만요리 만세!❞
길을 걷다보니 저 멀리 시끌벅적한 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고가 다리 밑에 외딴 섬처럼 불빛을 비추고 있는 한 선술집이 보인다.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지나치랴. 절로 술을 당기게 하는 분위기다.
가득 메운 메뉴판을 보니 뭘 시켜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 집 단골이라는 옆 테이블에 도움을 청하니
단골에게만 해주는 감자전이 별미란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나무 강판에 감자를 갈아 소금간만 약간.
메뉴 이름 따라 정말 정직한 감자전이다.
찰기가 있는 감자전 한입 먹으며 가게를 가만 살펴보니
이곳은 주인장과 손님의 경계가 없다.
단골들이 원하는 메뉴는 있는 재료 안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준다.
손님들은 술을 직접 가져가는 모양새가 익숙한 듯 하다.
이곳엔 법칙도 낯설음도 없다.
왠지 모를 정겨움 가득한 이 한상이 참 마음에 든다.
서대문을 천천히 돌아보니 도심 한복판 기찻길이 눈에 들어온다.
곧이어 기차가 들어온다는 땡땡 소리가 울려퍼진다.
기차를 보며 신나하는 박은혜 씨가 마냥 어린 아이 같다.

기찻길을 따라 가다 보니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발길을 붙잡는다.
오래 되어 보이는 창문 틈새로 떡볶이가 보인다.
47년 간 2대째 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인장의 말을 들으니
어찌 맛 보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
박은혜 씨는 10원에 떡볶이를 한 줄에 팔던
그 시절 그 맛 그대로라는데, 내 입엔 조금 달다.
기찻길이 바로 보이는 이 집 테라스에 앉아 있자니
마치 여행을 온 듯 하다.
❝어머니 때부터 47년 간 운영하는 곳
한국은 노포를 50년으로 치고 있으니까
곧 50년이 넘을 것이다.
수시로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정겹다.
스토리가 마구 생길 듯 하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른 식당은,
58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대문의 터줏대감 집이다.
퇴근을 한 직장인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다.
자욱한 연기에 달달한 냄새가 나는 것이
다들 돼지갈비를 먹고 있다.
삼겹살이 없던 시절 가족 외식 메뉴로 최고였던 추억의 고기다.

평소 해산물을 좋아하지만,
그 옛날 추억 때문인지 돼지갈비는 입맛이 당긴다.
한 쌈 한다는 박은혜 씨가 건넨 돼지갈비 쌈을 먹으니
자극적이지 않은 그 풍미가 입 안을 가득 채운다.
그 양념의 비결을 물으니 노포만큼이나 나이가 지긋한
여든 셋의 주인장이 직접 한다고 한다.
기본에 충실한 육수에 마늘과 생강, 간장
직접 담근 매실을 섞어 고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숙성을 시킨다.
15년 째 부사장을 달고 있는 아들에게 비법을 가르쳤지만
양념은 물론 고기 손질도 여전히 일일이 하고 있단다.
복권 당첨이 되어 시작했다는 사연도 재미난 집이다.
함께 한 식객 박은혜 씨에게 고기를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줬다.
돼지갈비 한 점에 작은 새우젓 하나.
요즘 고기를 즐겨 먹는 나만의 방법인데,
다행히 박은혜 씨도 좋아했다.
주인장의 손맛이 담긴 돼지갈비니 어찌 맛있지 않으리-
서대문 밥상을 맛 보니 신구가 공존하는 것이 참으로 매력적이다.
❝옛 것은 새 것에 밀려 차츰 없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말려달라고 할 수도 없다.
없어지기 전에, 눈이나 기억에 담아
두는 것이 상책이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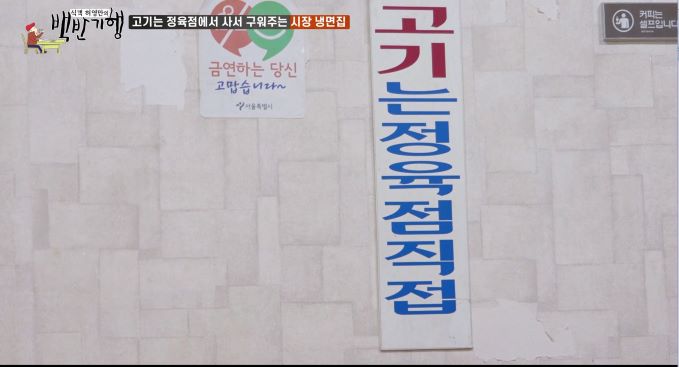











댓글 1
로그인그림이 다 너무 좋으니, 언제 한번 모아서 전시회 해주세요!